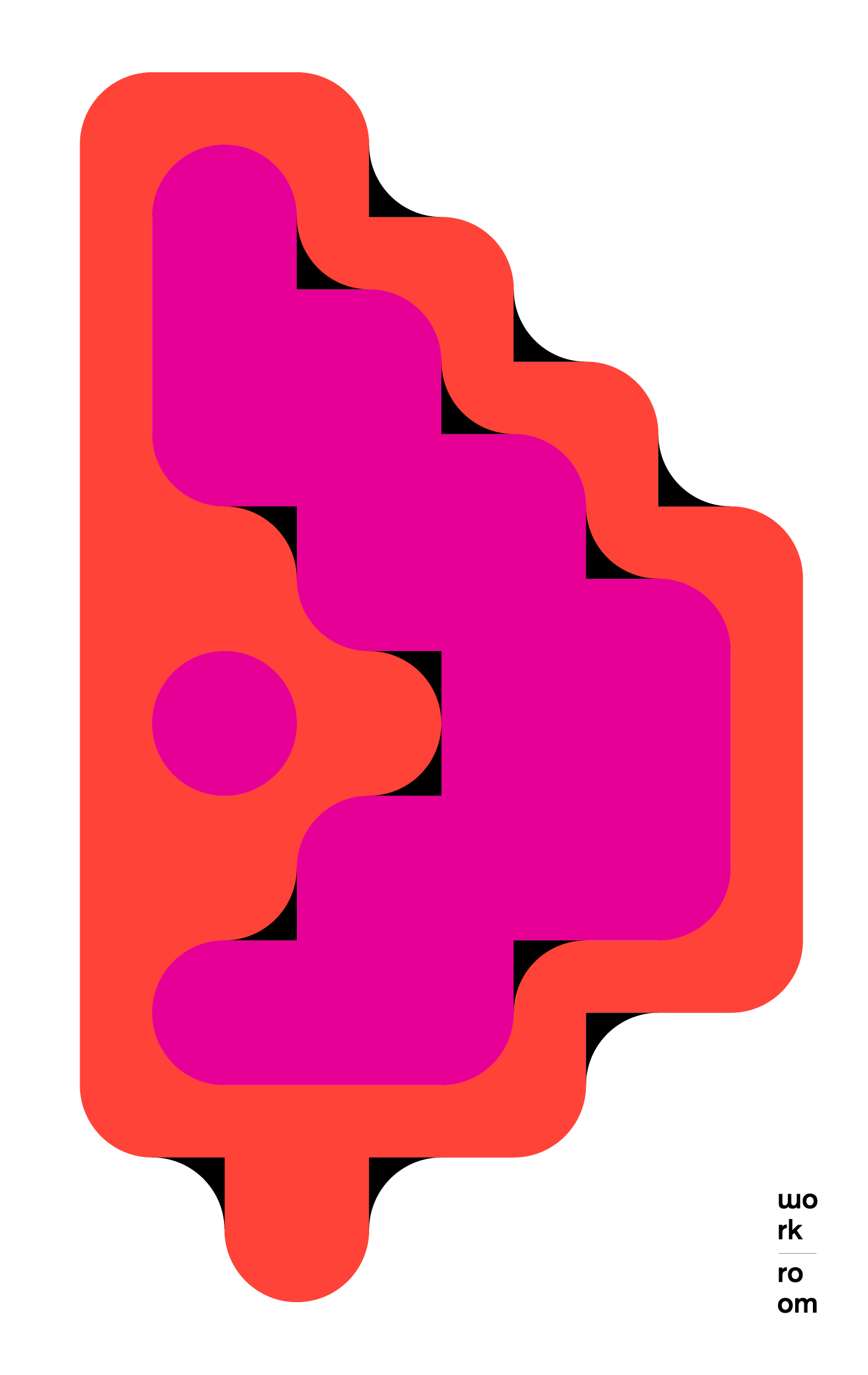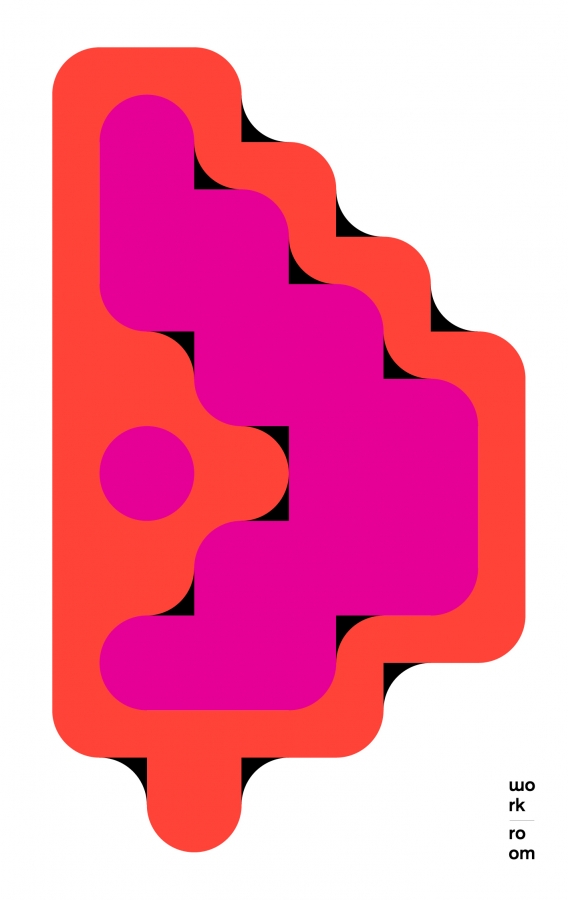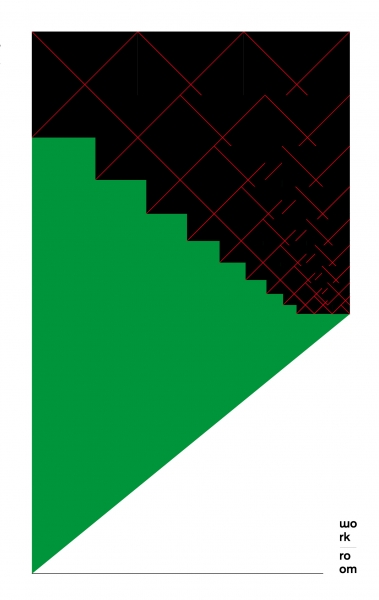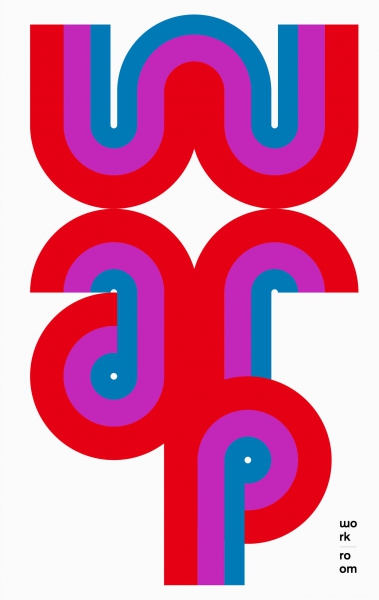정지돈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 것이다』는 워크룸 한국 문학 ‘입장들’의 세 번째 책이자 정지돈의 두 번째 단편집이다. 작가가 지난 3년간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한 글 다섯 편과 이 책을 위해 집필한 글 한 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글들은 서로 연관된다.
이 글은 언젠가 소설이 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 여섯 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As We May Think)」(2016)
「존 케이지와의 대화(Conversation with John Cage)」(2016)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Light from Anywhere)」(2018)
「사물의 상태(The State of Things)」(2018)
「해변을 가로지르며 / 바다를 바라보며(As You Would Cross an Empty Beach to Look at the Ocean)」(2019)
「All Good Spies Are My Age」(2017)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와 「존 케이지와의 대화」는 의도적으로 함께 쓰인 글들이고,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테마를 이어받는다. 「사물의 상태」는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와 직접 관련되며,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와 테마가 통한다. 한편 제16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 발표된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는 작가가 베니스로 떠나기 전 쓴 글이고, 이 책에서 처음 공개되는 「해변을 가로지르며 / 바다를 바라보며」는 작가가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돌아와 베니스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책 말미에 실린 「All Good Spies Are My Age」는 정지돈의 첫 단편집 『내가 싸우듯이』(문학과지성사, 2016)의 「일기 / 기록 / 스크립트」와 비슷한 위상의 글이다.
이 글들을 하나로 묶는 책 제목,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서 살 것이다(We Shall Survive in the Memory of Others)’는 빌렘 플루서가 1990년 4월 부다페스트에서 행한 강연 및 인터뷰의 제목을 빌려온 것이다. 빌렘 플루서의 강연 내용과 이 책에 수록된 단편들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느슨히 번역된 제목 아래 놓인 글들이 헐겁게 어울리면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뉘앙스를 전한다.
잔해들을 가로지르며 / 잔해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즈음 몇 가지에 꽂혀 있었다. 사이버네틱스의 역사와 미디어 이론에서 본 읽기 / 쓰기의 변화, 포스트휴먼 담론, 페미니즘, 존 케이지의 글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관심사에 따라 소설을 구상했고 (…) 세 가지 소설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교차되며 진행되는 형식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아이디어는 존 케이지의 강연록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서 얻었는데,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세 편의 짧은 소설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서술 과정에서 번번이 섞였고 부분들이 튕겨 나갔으며 어떤 조각들은 분산되어 흡수되었다. 나는 형식을 바꿔, 섞여서 서술되는 부분을 본문으로 두고 튕겨져 나온 부분들, 소설의 인덱스카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배니바 부시의 용어를 빌려 메멕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메멕스를 흡수한 소설과 소설에서 분리된 메멕스를 편의에 따라 분리했고 각각을 배치한 후 크게 덩어리를 나눠 두 편의 글로 완성했다. 메멕스(memex)는 메모리(memory)와 인덱스(index)를 합친 용어로 배니바 부시는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투하 한 달 전인 1945년 7월 『애틀랜틱 먼슬리』에 발표한 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에서 메멕스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이는 하이퍼텍스트나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개념이었다.” (「존 케이지와의 대화」, 본문 49~50쪽)
이 책의 두 번째 단편 「존 케이지와의 대화」에서, 정지돈은 ‘부분’과 ‘조각’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글을 쓰는 방식을 밝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이 책의 첫 번째 단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에서부터 등장했던 키워드 ‘memex’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의 일부가 정지돈이 읽고 메모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지만, 우리는 정지돈의 글과 다른 작가의 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 또한 알게 된다. 나아가, 이 글은 결국 작가 정지돈이 쓴 글임을 깨닫게 된다.
부분과 조각은 이렇게 다행히 소설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잔해로 남기도 한다. 정지돈은 자신이 생성한 잔해들 속에서, 잔해들을 가로지르며, 잔해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렇게 쓴다.
“자료 조사와 계획, 구상, 구성, 메모, 핸드폰 요금, 즐겨찾기 목록, 읽지 않은 책 더미와 언제 주문했는지 모를 택배 박스만 남았고 이 잔해들이 언젠가 소설이 될 수 있을까. 잔해들은 내면의 바다,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의 바다 위를 떠다녔고 잔해가 많을수록 작가에게 유리할까, 나는 생각했다. 하나의 작가가 지닌 잔해는 몇 명의 작가가 출간한 책과 같을까. 나는 그런 종류의 작가가 되길 원했다. 잔해들이 규명할 수 없는 연관 관계 속에서 반투명한 형체를 이루는 작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잔여물을 끙끙대며 안고 가는 작가. 부끄러움이 없는, 주저함이 없는, 생활의 궁핍으로 사고가 마비된 작가.”(「해변을 가로지르며 / 바다를 바라보며」, 본문 91쪽)
관찰, 기록, 은유
소설가 정지돈은 관찰자이자 기록자로서 역사 속 숨은 관찰자들과 기록자들을 찾아내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 대해 쓴다. 그런데 그 관찰 내지 기록들은 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글들이며, 그렇게 소설이 된다.
일례로, 첫 단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재닛 프리드는 1946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메이시 회의(전 명칭 ‘사이버네틱스’)에 비서이자 타이피스트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재닛 프리드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며, 그녀는 오직 회의록과 참여자들이 주고받은 편지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 적은 타자로만 존재해왔다. 이제 정지돈은 재닛 프리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녀는 기표가 녹음된 테이프에서 기록으로, 수정된 사본으로, 교정쇄로, 책으로 변형되는 물리적 변화를 주재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 — 기록 편집자 토이버, 미드, 폰 푀르스터, 회의 조직 담당자 프리몬트스미스, 의장 매컬러 — 은 내용을 걱정했다. 그러나 프리드는 소리를 글자로, 기호를 책으로 만드는 과정의 물질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본문 13쪽)
정지돈은 자신이 이러한 정보를 흡수하는 과정과 방식은 거꾸로이거나 엉망인데 이는 이를테면 전형적인 독학자의 경로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 내지 기록을 통해 자신이 정말 알게 되는 건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이것이 대체 소설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들에 대해 쓰는 것이 그들이 말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나 자신의 은유다. 그러므로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와 「사물의 상태」의 절반은 이 은유에서 왔다. 나머지 절반은 과거다.” (「해변을 가로지르며 / 바다를 바라보며」, 본문 92~93쪽)
『우리 자신의 은유(Our Own Metaphor)』. 정지돈은 단편 「해변을 가로지르며 / 바다를 바라보며」에서, 자신이 사이버네틱스를 연구하면서 참고했던 이 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소설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 ‘우리 자신의 은유’라는 말은 곧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은유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찰자다.”(본문 93쪽) 만일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정지돈의 소설을 읽어내는 유용한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한 회의의 비서이자 기록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러나 생각해보시오, 베른하르트, 당신은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의 편집자와 조판 디자이너와 영업자와 유통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책이 나오기 위해 기능하는 물질적, 인적 기반들에 대해 아주 사소한 사실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작은 힘들이 모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결부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 아무런 인식 없이 넘어가고 그러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발전되어온 추상화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하고 망각하고 가르고 나누지 않고는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고 점점 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흡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현실인 양 행동해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게 신경 구조가 생겨먹었거나 그러지 않으면 폭발하는 기억과 감각으로 인해 돌아버릴 거라는 공포감 때문인지, 인지 스스로 인지 고유의 편협성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라고 하인츠 폰 푀르스터는 말하며 자신이 직접 땅을 일구고 집을 세운 래틀스네이크 힐의 쉽게 바스라지는 갈색 흙을 으깨듯 밟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본문 11~12쪽)
우리는 메신저와 구글과 네이버와 트위터와 유튜브를 동시에 사용한다. 서로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컴퓨터로 보고 있는 영화의 캡처 이미지, 방금 올라온 악플, 애플뮤직 링크가 활용되고 공적 사실, 사적 기억, 타인의 창작물이 무차별적으로 병치된다. 이것은 21세기 버전의 터키시 무비로 나는 글을 쓰며 음악과 영상, 사진으로 옮겨 다니고 방향을 전환하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이들은 이미 글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글에서 온도 변화를 느끼고 악기가 연주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어떤 영상물은 음악과 영상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책이 되었다. 그렇다면 소설이나 시가 굳이 필요할까. 기술이 공간을 통합시켰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현대적 살롱이 책처럼 손에 들어왔는데, 텍스트 내의 완결된 세계를 통해 감각적 환기와 대리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소설이나 시에 무슨 큰 재미가 있는가. 그건 자폐적인 세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자폐적이란 말은 내 소설이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하다. 캐서린 헤일스는 움베르토 마투라나의 자기 생성 이론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자폐아에게 오히려 더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소통 체계 속의 자폐아다. 우리는 언어를 교환하는 규칙의 세계를 만들고 외부의 체계와 자신의 체계에 동시에 갇힌 이중의 자폐아다. (「존 케이지와의 대화」, 본문 54쪽)
글을 쓰기 시작하면 계절은 무의미해지고 일상생활의 관계도 무의미해진다. 세계와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칩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자아로서의 내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다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세계가 뒤로 물러나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부상한다. 그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아니다. 아래 숨겨져 있거나 조각난 채로 흩어져 있어 보지 못했던 세계, 가능성만으로 존재하는 세계다. 소설을 쓰는 것은 세계와 관계 맺는 과정이고 그것은 모니터 속의 작업이 아니라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작업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의 신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세계에 기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한 세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세계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나뉘어져 있지만 나머지 한 세계가 없이 존재하지 않는 두 세계다. 다시 말해 두 세계의 관계가 곧 세계다. 그러므로 관계의 복원은 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해변을 가로지르며 / 바다를 바라보며」, 본문 95~96쪽)
차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 케이지와의 대화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
사물의 상태
해변을 가로지르며 / 바다를 바라보며
All Good Spies Are My Age
저자
정지돈 — 소설가. 『내가 싸우듯이』(문학과지성사, 2016), 『문학의 기쁨』(공저, 루페, 2017), 『작은 겁쟁이 겁쟁이 새로운 파티』(스위밍꿀, 2017), 『팬텀 이미지』(미메시스, 2018) 등을 썼다.
편집
김뉘연
디자인
김형진